| 전문 헤드헌터가 말하는 직종별 몸값 올리기 전략 [분야 3] - 금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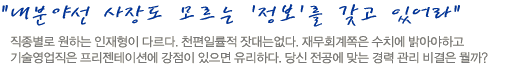 |
|
||||
| “스페셜리스트만 롱런할 수 있다” | ||||
|
||||
반도체처럼 시가 총액이 큰 업종을 담당하면서 각종 순위에서 랭킹이
높은 경우 수억원씩 받기도 하지만 3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도 있다. 자기 적성과 특기를 잘 파악해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몸값을 올려 나갈 수 있다. 금융의 기본 특성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듯이, 연봉 역시 직무 성격에 따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이다. 회사보다는 내 이름값 높여야 증권사 금융공학팀에서 ‘백오피스’(Back Office) 업무를 담당하던 K대리(32)는 최근 은행 장외 파생상품 트레이더로 자리를 옮겼다. 기본 연봉만 4000만원대에서 6000만원으로 50% 몸값을 올렸다. 애초부터 트레이더를 꿈꾸며 꾸준히 준비한 덕에 적절한 기회를 잡아 몸값을 늘려 간 경우다. 그는 “단순히 월급 늘어난 것보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게 소득”이라고 말한다. 반면 일선 현장에서 트레이더라는 직무는 한 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스트레스에 고스란히 노출돼 업무 강도는 높아진 셈이다. 지난 2003년 8월 경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L과장(33)도 이직을 통해 연봉을 크게 높인 경우다. 약학석사로서 국내 화학업체 연구소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1년 증권사 제약 애널리스트로 말을 바꿔 탔다. 제약 부문에 대한 지식과 관련 네트워크가 좋아 자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기업 분석을 위한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경험이 달렸다. 그는 “2년간 밤낮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노력했다”며 “2년을 구르고 나니 업계에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시간외 근무가 많았음을 반증해 준다. 이때 모 그룹 경제연구소에 자리가 생겨 응시, 2번째 전직을 했다. 그의 판단은 애널리스트로서 그때마다 시의성 있는 마켓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보다 펀더멘털에 가까운 연구 작업이 적성에 맞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L과장 역시 기존보다 50% 상향 조정된 7000만원대 연봉으로 회사를 옮겼다. 성과급까지 감안하면 1억원대 소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케이스는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이직에 성공한 경우지만, Y팀장(42)은 한 우물을 파면서 몸값을 올린 경우다. 그는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증권회사에 입사해 올해 16년째 한 회사에서 그것도 같은 직무만을 맡아 왔다. 전형적인 관리직으로서 사옥 관리, 지점 신설, 이전, 폐쇄 등이 주요 업무였다. 그러나 업력이 다져져 금융 지식과 부동산 지식이 겹쳐지면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부동산 금융의 최고급 전문가로 자리매김한다. 이제 부동산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하나의 매개일 뿐이다. 부동산만 다루는 게 아니다. 그는 아시아 최초 선박 펀드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금이나 원자재까지 금융상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그의 손에서 파이낸싱의 대상이 된다. 이를 만들어낸 그 자신 몸값도 어느새 금값으로 변한 것이다. 어떤 경우건 금융업종에서 성공하고 계속 몸값을 올려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치열함’이다.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다. 잠시도 자기 계발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소속한 회사가 어디든 치열하게 자신의 스페셜티를 갖춰 놓은 사람들이다.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면 다 잘할 수 있다는 자세보다는 이 부문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스페셜리스트 의식이 필수다. 길어지는 불황 속에서 금융업종은 끊임없는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에 던져져 있다. 스페셜리스트만이 그 소용돌이를 이겨낼 수 있다. 당신도 치열함으로 무장시킨다면 오히려 불황의 혜택을 받는 돋보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
|
| |
|



